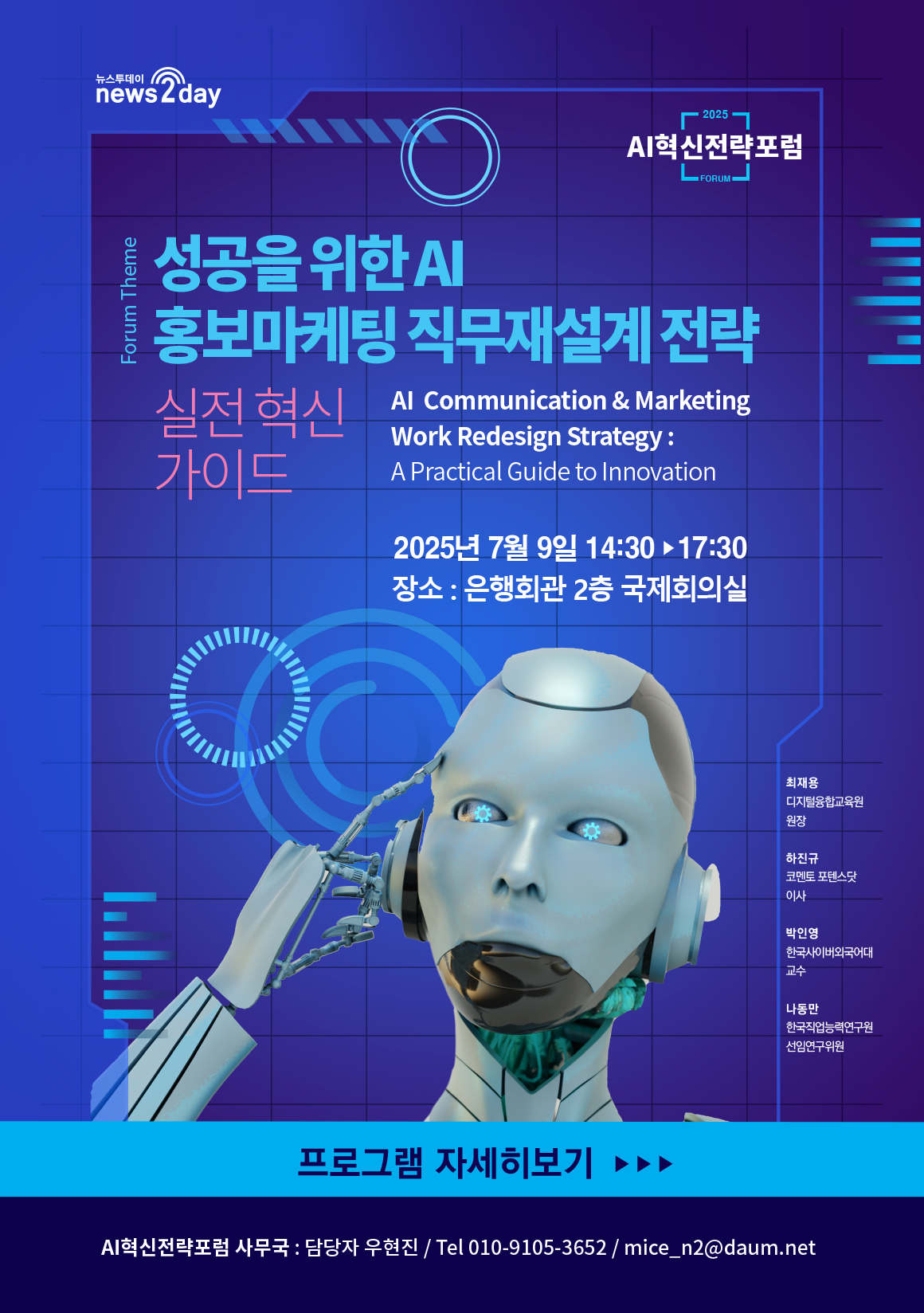[데스크칼럼] 로보락·트럼프 보면 삼성만 ‘사즉생’ 외칠 일 아니다
'중국발(發) 기술 굴기'라는 뉴노멀 시대 활짝 열려
방심하면 '소니 전철'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경제호(號) 빨간불
전세계 첨단기술 경쟁에 현실 안주하면 끝장
핵심역량 경직성 벗어나 기술 초격차로 승부해야

[뉴스투데이=김민구 부국장]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업체 가운데 로보락과 BYD가 눈에 띈다.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은 로봇팔이 부착된 청소기까지 선보여 삼성전자와 LG전자 도전을 물리치고 국내 시장점유율 45%로 업계 1위를 거머쥐었다.
BYD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자동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가운데 BYD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해 미국 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일개 배터리 업체로 출발한 ‘다윗’ BYD가 ‘골리앗’ 테슬라를 제치고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호령하는 게임체인저로 우뚝 섰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이 두 업체는 모두 중국 기업이다.
그동안 우리가 탄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해온 가전과 자동차 부문에서 중국 기업이 시나브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로보락과 BYD에 이어 우리에게 얼마 전 큰 충격을 안겨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까지 중국발(發) ‘기술 굴기(崛起,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라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시대가 활짝 열렸다.
혹자는 BYD 등 중국 업체의 도전이 국내 가전과 TV 맹주의 공격경영에 밀려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대륙의 실수’라는 꼬리표가 붙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지만 국내 시장점유율 ‘0’에 그친 샤오미의 전철을 이들 두 업체가 밟을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보락과 BYD의 최근 광폭 행보를 보면 국내 업체들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문득 소니가 떠오른다.
한때 전 세계 전자제품 업계 ‘아이콘’의 위용을 떨친 소니는 지금 전세계 가전 시장에서 예전의 존재감을 잃은 지 오래다.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첨단 기술개발에 소홀해 지금은 잊혀진 이름으로 전락했다.
소니, 노키아, 모토로라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핵심역량의 경직성(Core Rigidities)’의 대표적인 예다.
폴 데이비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스탠퍼드대 교수가 1985년에 주창한 개념인 경로의존성은 일정 제품이나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 되더라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경로의존성은 ‘고착화(lock-in)’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기업이 기존에 익숙한 경영방식만 고집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펼쳐질 때 ‘고인물’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첨단 기술 전쟁에서 낙오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핵심역량의 경직성도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요소다.
도로시 레너드 바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1992년 발표한 논문 ‘핵심 역량과 핵심 경직성: 신제품 개발 관리의 역설’에서 처음 등장한 핵심역량의 경직성은 기업 핵심역량이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전통적인 핵심역량은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경직성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어(Traditional core capabilities have a down side, called rigidities, that inhibits innovation) 기업이 기존 인기제품 등 특정 역량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게 바튼 교수의 주장이다.
그동안 회사를 먹여 살린 주력 기술이 새로운 첨단 기술 등장으로 자칫 회사 발전을 막는 기술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전세계 TV·가전·스마트폰 등 IT 시장을 놓고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이 ‘죽기 살기’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잠시 방심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
IT업계에서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외생변수는 이것 뿐 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동맹국 등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 thy neighbour)'의 전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는 거대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엄습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외치며 세계화를 이끌어온 국가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교역국이 자유무역을 따르지 않으면 '슈퍼 301조'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해왔다. 그런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내세워 자유무역을 도외시하는 것은 자기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 보호주의 상징인 관세 카드를 빼들어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는 출범 30년만에 중대 위기를 맞았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이번 도박이 미국 경제에 반드시 도움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을 맞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후버 대통령은 집권 후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2만여 가지 수입품에 59~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단행했다. 이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교역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해 세계 교역과 소비가 급랭한 점을 트럼프가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주요 교역국 경제를 희생하며 자국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정책의 결말은 공동 번영이 아닌 공멸이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트럼프 선거공약이 효험을 발휘하려면 자유무역 확대가 정답이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모든 계열사 임원에게 ‘사즉생(死則生·죽기로 마음먹으면 산다는 뜻)’을 주문하며 최첨단 기술로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주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 고(故)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외친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 혁신을 외친 화두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재용 회장 요구처럼 삼성전자는 기존 강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든 사업영역에서 중국 등 후발자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기술 초격차와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사즉생 선언’이 삼성전자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TV, 냉장고, 스마트폰, 철강, 조선, 기계, 정유, 석유화학 등 우리 주요 산업에 중국, 인도 등이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혁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경쟁국에 밀리면 우리 기업이 ‘소니’, ‘노키아’, ‘모토로라’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이제는 국내 모든 산업이 ‘사즉생’을 외치며 끝없이 펼쳐지는 첨단 기술 전쟁에 임해야 한다.
주춤하면 벼랑끝으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과거 성공에 안주해 경로의존성과 핵심경직성의 칵테일을 들이키면 결말은 치명적이다.
첨단 분야 선발 기업을 따라잡으려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단계를 지나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는 중국의 역습을 극복하려면 초격차 기술력과 혁신 정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갖추는 것이 해답이다.
BEST 뉴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